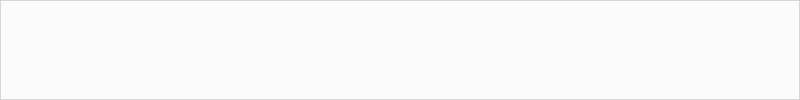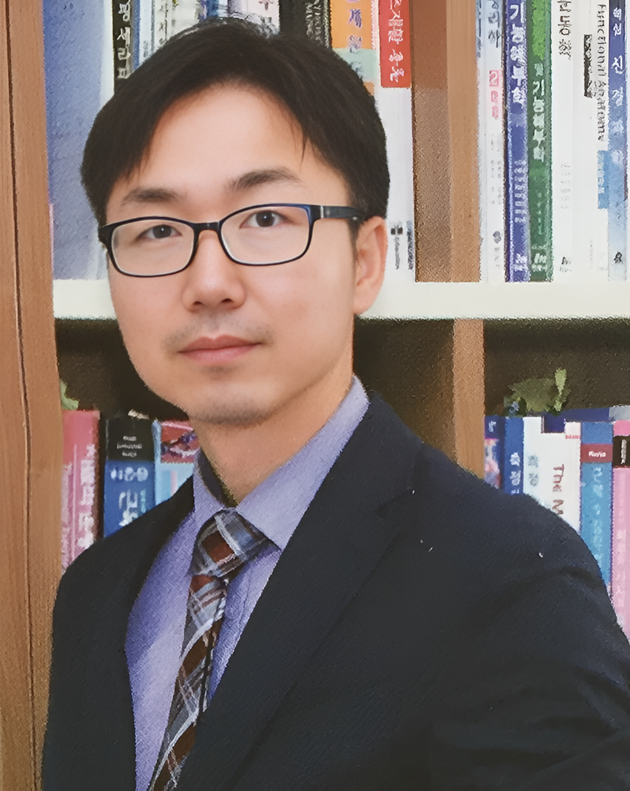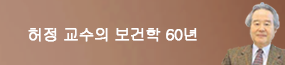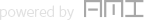최근 한국 사회는 러닝(Running) 열풍에 빠져 있다. 하프마라톤 대회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열리고, 러닝크루·동호회·SNS 챌린지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함께 달린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접근성과 함께 달릴수록 더 즐거운 경험이라는 커뮤니티 특성이 맞물려, 러닝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 자기계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달리기의 장점은 분명하다. 유산소 운동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율적인 운동으로, 심폐기능 강화, 체중 조절, 혈압 안정, 당 대사 개선에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달리기는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매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달리기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 불리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근 후 5km 러닝이 일상처럼 자리 잡는 것도 이런 심리적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에는 놓치기 쉬운 그림자도 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질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운동 경험이 부족한 초보 러너나 중장년층,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 무리한 달리기 시도는 오히려 관절 및 인대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족저근막염, 슬개건염, 무릎 관절염, 정강이 통증(Shin splint), 허리디스크 악화 등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러닝 습관과 의학적 이해는 필수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준비시켜야 하며, 본인 체력과 목적에 맞는 거리와 강도로 훈련을 구성해야 한다. 무리해서 더 오래,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회복이 포함된 훈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러닝의 핵심이다.
또한, 러닝화는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발 구조와 주법에 맞는 기능성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500~800km 사용 후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쿠션이 닳은 신발을 오래 신는 것은 마치 마모된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러닝 중에는 신체의 이상 신호에 민감해야 하며,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경우 즉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의지는 의학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인지, 치료가 필요한 손상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붓기·멍·관절의 불안정성·밤에 쑤시는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만성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
러닝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성취감, 정신적 회복력까지 키워주는 매우 훌륭한 운동이다. 하지만 운동의 본질은 지속성에 있다. 유행에 휩쓸려 무리한 도전만을 반복하다 보면 부상과 좌절만 남는다.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신체 신호를 존중하는 자세가 진정한 러너의 자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누구보다 빠르게가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달리는 것. 그것이 건강 러닝의 본질이자 진정한 삶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일 것이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