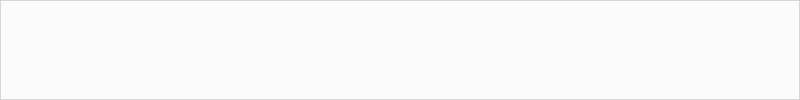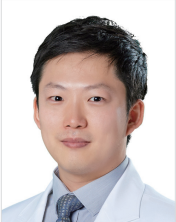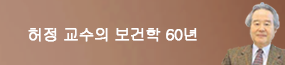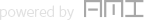현재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전체 변이는 약 60개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나 유전병관련 원인유전자는 수천개 이상이 이미 밝혀졌지만 희귀질환이므로 이용빈도는 매우 낮다. 암의 경우 현재까지 모든 종류의 암에서 140개의 원인유전자 변이가 발견돼 암의 표적치료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치매 등의 만성병에서의 변이연구는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변이는 유방암의 브라카(BRCA)변이이다. 안젤리나 졸리의 용감한 기자회견으로 유명해진 이 변이는 80%의 높은 유방암 발병율을 갖고 있어 예방적 유방절제술 시행으로 치료로 이어지고 있다. 암조직 게놈분석의 경우에는 폐암의 EGFR변이와 흑색종의 비라프(BRAF)변이가 실제 표적치료로 연결돼 치료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유전병분야에서는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에서 CFTR유전자변이와 다른 7개 변이를 함께 검사해 진단에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HIV치료제인 avacavir투여시 독성이 HLA변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전체변이가 약물독성예측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상기 변이를 포함한 8가지 중요 변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2만 9000달러인데 비해 전장게놈분석비용은 한번에 1000달러로써 모든 검사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임상 서열 분석시장은 현재 2조원 정도이며 3~5년이내 수십 조의 급격한 신장이 예상된다. 영국의 Genomics UK 계획, 사우디의 Arabia genome project, 그리고 미국 Regeneron사의 게놈계획까지 10만명 게놈 분석 계획들이 이미 시작됐다. 전체적으로 10만명에서 백만명 정도의 개인 게놈정보들이 분석되면 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컨텐츠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아시아인과 같은 특정 인종의 게놈분석은 따로 시도해 특정 인종별 컨텐츠까지 확보돼야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시안 게놈계획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유전체 데이터를 병원 질병관리 시스템으로 넣기 위해서는 개인의 게놈정보와 진료기록이 함께 잘 관리돼야 한다. 다시 말해 진료와 게놈연구가 동시에 추진돼야만 각종 변이의 질병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다. 앞으로 3~5년내에 큰 병원들은 질병-게놈연구를 위해 외부게놈정보 전문회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배우는 보건의료체계(learning health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가이싱어 보건의료 시스템(Geisinger health system)은 지난 3년 동안 주민 260만명을 대상으로 만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입원율을 18% 낮추고 의료비도 7%나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이싱어에서처럼 만성병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유전체 정보를 병원 전자기록(EMR)과 본격적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면 저효율 고비용구조의 현대의학이 새로운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