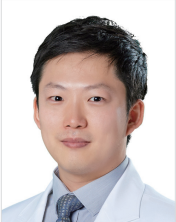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및 주제별 연수교육에서 의료계는 이같이 한탄하며 여전히 한목소리를 냈다. □ "적정수가 보장만이 의료 질 보장" 이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는 ‘DRG 지불제도의 취지와 의료의 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RG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하지 않으려면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DRG는 합리적인 의료비의 관리 수단으로서 역할과 왜곡된 수가체계를 위한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의 질 유지가 가능한 적정 수가 보장 △의료의 질과 DRG 수가의 연계 △의학발전에 필요한 신의료기술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는 7개 질환에 대한 DRG는 구시대로 가는 역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관 주도의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 환자마다 병증 달라…7개 질환 DRG “말도 안돼”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장은 “DRG를 7개 질환만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면서 “이 제도는 실제로 미래를 걱정하고 의료를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비뇨기과와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DRG는 타과 컨설트를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라며 “현재 있는 행위 자체도 못하게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은 꿈도 못꾼다. 진료 패턴이 바뀌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획일적으로 한 수가에 묶여 버려 다른 질환을 볼 수 없게 만들뿐더러, 의료의 질 자체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의사는 진료 뿐 아니라 관리 부분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보건행정하는 사람들은 임상에 있는 의사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원가, 분류기전, 조정기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정작 손을 놓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임상의사나 임상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 등 작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돈을 더 늘리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적정기본수가 확립과 환자분류체계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역시 DRG는 의료인을 시험에 들게 하는 굉장히 나쁜제도라고 비난했다. 송 부회장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처치를 해줄 병원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다"며 "예전같이 병원 경영이 어렵지 않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적자 상황에선 선의의 치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로 의료를 엎어놓고 죽게 만들어 곧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송 부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보장의 적정 기본수가 확립과 환자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정책 결정이 문제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가지고 이상적인 정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행위별 수가제로 돌아갈순 없다” 토론을 들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저수가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DRG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지불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화 등 향후 의료비용 증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함"이라며 "건강보험이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보장이 약하다는 것이다. 보험료의 비용 부담 수준이 낮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정부는 보장과 관련해 늘 고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 수가를 보상해 주려고 항상 고민한다"며 "양의 통제를 어떻게 하고 비급여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도 늘 고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질적으로 노력하고 실제 많은 제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성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관은 "포괄수가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불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이라며 "앞으로 나라의 상황, 현재의 여러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고 변형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질 하락은 보완해야 할 문제지 다시 행위별 수가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정부는 공급자 협조가 없으면 우리는 제도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DGR 시행이 5개월이 됐다. 그러나 원가 보존에 맞는 적정수가 보상 등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의료계의 우려와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의 마찰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