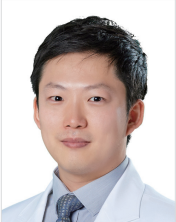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1) 포괄수가제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행위별수가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아주 간단하다. 병원에서 한 ▲검사 ▲치료 ▲주사 ▲약 등을 일일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즉, 치료행위 하나하나가 다 병원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할수록 , 또 주사를 많이 맞을 수록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비해 ▲포괄수가제는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가 환자를 그 등급에 따라 분류한다. 이 등급은 사전에 조사를 통해 병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와 증세가 비슷해 치료방법이 거의 유사한 환자들끼리 구분돼 있다. ■ 포괄수가제, 7개 질병 환자...78개 등급으로 분류 이 경우도 몇 안 되는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이 7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78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병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4가지의 체계가 있어 총 분류기준은 사실상 320개가 된다. 즉 7개 질병을 320개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각 등급에는 전체 진료비가 있고, 의사는 그 금액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다. 환자는 그 전체병원비 중에서 이미 정해진 자기가 부담할 금액만을 내면된다.(단, 입원일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당연히 오래 입원할수록 많이 내게된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위 7개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내 병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이다. ☎☞2)포괄수가제 대체 왜 해야 하는가? 실제로 병원에서 "왠 검사를 이리 많이 하나?...대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많나?"에 대해 궁금하고 답답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료비가 커진다. 그러다보니 때때로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거나 약을 더 많이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료비를 늘리는 경우가 있을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14.6일에 병원에 따라서 입원일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비슷하게 아픈 사람인데도 입원한 날짜수의 차이가 많이 남을 의미함.), 전체 입원비나 CT나 MRI 같은 고가의 영상장비가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는 'OECD 최상위원'으로 당연히 진료행위(검사나 항생제 사용)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포괄수가제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막고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자는 것이다. ☎☞3)포괄수가제 대체 국민입장에서는 뭐가 좋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포괄수가제가 대체 환자에게는 뭐가 좋은 걸까?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장성이 확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장성 확대는 결국, 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부분은 늘어나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예전에 비급여항목이라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내 진료비가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담해 줌 -예들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하는 ▲각막형태CT,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수술에 사용하는 ▲코블레이터, 맹장수술에 쓰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찢어진 상처를 붙이기 위한 액체 접착제), 자궁수술 시에 수술한 부위 주변 조직들이 들러붙는 것을 막는 ▲자궁유착방지제 등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경우 4만원~30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해야(비급여) 했던 것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환자는, 20%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나아가 진료행위를 늘일 이유가 없다보니 불필요한 검사나 항셍제 처방 등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요인도 없어졌다. 예전에는 대체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진료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를 미리 준비하기도 쉬워진다. ☎☞4)같은 돈이면 당연히 비용을 적게 써서 이윤을 남기는 게 정상이지 않나?...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체계는 현 행위별수가제의 평균적인 진료비 수준에서 평균 18% 정도를 더 책정해 두었다. 즉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의사가 했던 진료행위에 쓰인 비용에다 20% 가까이를 더 책정해 둔 것이다. -과소진료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예전에 행위별수가제로 진료하던 때에 받았던 진료비에 20%가 더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의사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일 터 이므로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예전보다 적게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과의 경우에만 진료비가 예전에 비해서 내려갔다. 이것은 정부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안과학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맞추어 수정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정부가 일부러 내린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병원간의 경쟁이다. 만약 포괄수가제 아래에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낮추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환자들 사이의 실제 입소문은 물론이거니와 SNS 등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그 병원이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다. -결국, 어디서나 같은 진료비라면 국민들은 의료소비자로써 인터넷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 중에서 더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진료하다 보니 예상 밖으로 진료비가 들어가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0만원만 지급되는 환자로 들어왔는데 치료하다보니 2000만원이 넘게 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 그래서 그 환자들도 충분히 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해 뒀는데, 이를 '열외군 보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만원 진료비로 책정된 환자가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책정된 금액보다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경우(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또, 진료행위는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차도가 없다던지 하는 이유로 입원기간이 길어진다면, ▲30일까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30일 이후부터는 다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환자를 진료하는데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 ▲에이즈환자와 ▲혈우병 환자는 수혈 및 합병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유로 병원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이상 알기쉬운 포괄수가제 상(上)...다음호에 계속> |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