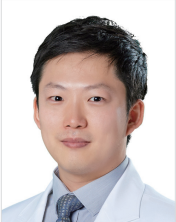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
최근에 J모 탤런트가 신체 직접뜸으로 암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침구계 역사상 신체에 직접뜸을 떠서 암을 치료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 어느 침구인으로부터 듣기를 위암 환자에게 복부에 침ㆍ뜸 시술로 며칠간은 시원하고 평안한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악화돼 죽었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계에서는 암 치료시의 부작용 해소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정도다. 암이면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지 신체의 직접뜸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신체의 뜸을 태우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② 직접뜸 태워서 염증(구창), 상처 - 면역력 저하 위험 고전 동의보감에서는 뜸을 뜨면 구창, 상처, 화상이 생겨야 병이 낫는다고 기록돼 있다. 염증, 화상, 상처가 생기면 백혈구가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과립구가 증가해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과립구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림프구가 줄어든다. 과립구는 비교적 큰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미세 세균, 미세 바이러스는 림프구의 TㆍB세포들이 제거한다. 림프구와 과립구는 길항관계에 있는데, 과립구가 증가하면 림프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면역의 핵심인 면역세포(TㆍB세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린다. 과립구로 인해서 화상·상처·종기 치료에는 효과가 있으나 인체에 더 무서운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피던 때의 이론이며, 현대의학적 차원에서는 참으로 당치 않은 뜸법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각종 감기, 독감, 발열, 전염병, 암, 각 장기의 질환들이 나타나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뜸을 떠 피부를 태우고 상처를 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 침ㆍ뜸을 몇 십 년 연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밝힌 명확한 이론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③ 직접뜸의 화농 일으키는 것 - 산화와 노화촉진 작용 인체에 뜸을 떠서 구창이 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창을 내게 하고 7~77장까지 뜬다면 구창은 반드시 화농이 된다. 화농은 과립구가 죽은 것으로 독성이 있어 정상세포를 공격해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노화촉진 작용을 일으킨다. 근래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화를 막으려고 수많은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 것은 염증, 종기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구태여 화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약ㆍ침ㆍ뜸들은 자체의 실험방법도 거의 없고 효과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으니 그 질병이 치료되는지 악화되는지의 실험방법도 없고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뜸 시술은 큰 반성을 해야 한다. 목욕탕에 가서 옷 벗은 남자들을 보면 목, 등줄기, 팔마다 뜸을 뜬 상처 자국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뜸들은 기분상 좋게 할 뿐 인체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2008년 12월 31일 ‘뜸 자율화 공청회’ 장소에서 배포한 ‘여의도통신’에 김춘진 의원이 쓴 글을 보면 국회의원 강○○ 의원이 의원 전용 목욕탕을 가보니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몸에 뜸 상처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뜸이 좋은 줄 알고 뜬 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줄도 모르고 뜬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④ 직접뜸 화상 - 인체에 해로운 방법 뜸의 효과(경락작용) - 거부반응이다 최근의 뜸들은 동의보감처럼 굵게 만들어 뜨지도 않고 쌀알이나 쌀알반만 하게 뜨고 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상처가 난다면 모두 부작용이 발생한다. 신체 뜸의 열자극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 뜸의 화상 자극을 경락작용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락이나 그 작용도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필자가 음양맥진법으로 직ㆍ간접뜸을 신체의 경락에 뜬 결과 경락은 침ㆍ뜸 거부반응 조직이었다.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경락이란 침ㆍ뜸 거부반응 조직이므로 침ㆍ뜸으로 경락ㆍ경혈에 자극을 주면 교감신경을 긴장ㆍ항진시켜서 건강을 크게 나쁘게 하는 것이다. 뜸을 뜨면 처음에는 도파민ㆍ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해서 기분 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낄 뿐 인체에는 해롭다. 경락의 직접뜸 효과 이론은 어느 한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