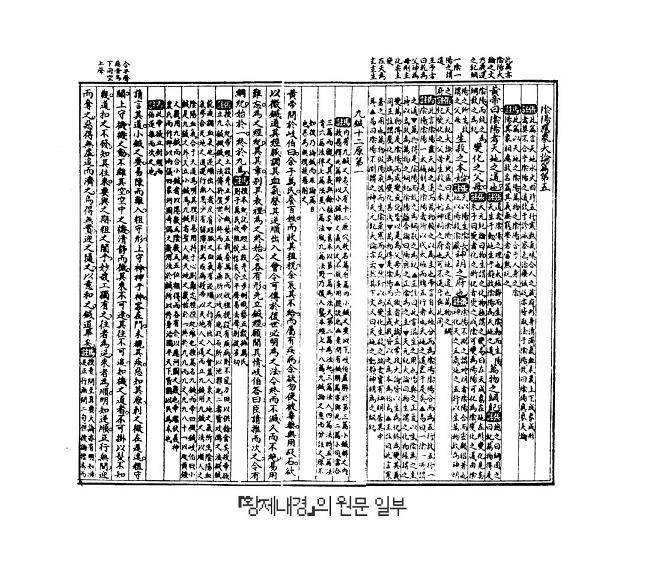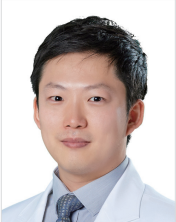학자들도 “경락 실체 모르겠다” ■ 고전에 나와 있는 경락이론들 전통적인 침구치료는 경락을 자극함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락이론은 약 1200여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에 기록돼 있다. 120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현재에도 전 세계의 침구사, 의사들이 경락을 따라서 침ㆍ뜸 시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1200여 년간 널리 이용된 경락의 침구치료가 우주과학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경락을 따라서 침구치료를 하고 있으나 정작 경락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경락을 따라서 침구 시술을 하고 있다. ‘황제내경’에서 경락계통은 전신을 거미줄처럼 많이 그려 놓았다. 12경맥(6장 6부에 연결돼 전신에 펼쳐진 선들), 경별, 경근, 기경, 낙맥, 지맥, 손락을 그림 상으로 그어 놓았다. 이것은 전신에 모세혈관이나 림프관, 말초신경망처럼 그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락을 영추(靈樞)에서 말하기를 “12경맥은 안으로는 장부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관절에 연결하고… 이러한 경맥은 사람의 생사를 능히 결정짓고, 백병(모든 병)의 허실을 조절시키고 경락은 전신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또한 영추의 경수편(經水篇)에 “경맥은 혈을 받아서 영양(營養)한다”고 했고, ‘소문’의 이합진사론(離合眞邪論)에서는 “경맥은 맥이 움직이는 바탕이다. 경락이 혈맥 속으로 들어가 행하다가 손에 있는 촌구맥에 들어가 움직이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고 했다. 이같이 경락계통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경락계는 12경락과 기경8맥이다. 기경8맥 중에서도 고유의 맥로가 있는 임·독맥경을 합하여 14경락이라고 한다. 이들 14경락에 354여개 혈을 지정해 이들 경락·경혈에 침ㆍ뜸 치료를 하고 있다. 이같이 경락·경혈에 침ㆍ뜸의 자극을 주는데 과거에는 침들이 굵고 길었으며, 대침으로 자침하므로 그 고통은 대단히 심했다. 그리고 뜸의 경우는 ‘황제내경’에서는 몇 마디만 언급했고, 송나라 때 ‘침구자생경’부터 뜸법이 성행했고 그 당시의 뜸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동의보감’까지도 그 뜸법을 전재 인용했으며, 뜸을 뜨면 반드시 구흔(灸痕:상처·화농)이 생겨야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전신의 요혈에 뜸을 마구 떠온 것이다. 이러한 침ㆍ뜸이 근대까지 내려오고 서양에까지 널리 알려져 침구치료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침구치료의 핵심인 경락의 작용이나 실체, 그리고 침구치료의 과학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락에 대한 관련설 - 확실한 정의나 근거제시가 아직 없다 전 세계의 학자들은 경락의 연구에 대해서 거의가 “잘 모르겠다”는 결론이며, 과거 일본에서는 경락·경혈은 내장의 병적반사점이라고 했으나 내장 반사점과 100% 일치하지는 않았다. 최근 미국 얼바인 대학에서 조장희 박사가 발에 있는 어느 경혈에 자침했을 때 대뇌의 일부분이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해 경락의 입증을 기대했었으나 2006년에 이 논문을 취소했다. 이유는 경혈이나 경혈이 아닌 곳에 침 자극을 주어도 대뇌 반응엔 차이가 없었으며, 침의 효과도 개인의 자극 주기에 따라 차이와 효과가 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1940년대 북한의 김봉환씨가 경락의 대발견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침구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락이란 봉환관이고, 경혈은 봉환소체라고 했으나 정작 해부학 교수들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 물체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누구든지 봉환관을 확인한 적이 없다. 또 얼마 전 S대학의 S교수가 봉환관을 혈관 속에 특수한 ‘관’을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론이었다. 현재 전 세계는 ‘경락’을 확인,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대의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명,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락·경혈에 침ㆍ뜸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정작 확인되는 근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침ㆍ뜸의 치료 효과기전이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이론들을 보면 신경이론, 자율신경 관련설, 호르몬 관련설, 항상성 기능 조절설 등 많이 말하고 있으나 확실한 정의나 근거 제시도 못하고 설로서 끝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의 모 학자가 침술을 시술하면 몰핀보다 수십 배의 진통효과가 있다는 엔도르핀을 분비한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엔도르핀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극도로 기분이 좋을 때(예:섹스할 때 최고의 기분을 느끼는 순간) 분비된다고 한다. 과연 침구치료를 할 때 아프고 불안하여 긴장하는데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엔도르핀이 분비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 이후 추가적인 과학적 해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뜸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에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왔었다. 뜸을 뜨면 백혈구가 증가하고, 이종단백체가 생겨서 면역효과가 있다고 했었다. 뜸을 떠서 상처·화농이 생기면 백혈구가 당연히 증가되고 이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과립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반대로 림프구는 줄어들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다). 이종단백체라는 말은 면역학이 발달하기 전의 가상이론이며, 이종단백체의 작용은 아직 분명치 않다. 면역학에서도 이종단백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면역에 대한 이론은 면역학에서 대단히 많은 연구가 있으나 침ㆍ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만 항암치료시 구토를 진정시킨다는 정도다. 지난달 한 방송사에서 화상치료에 침 시술할 때 화상이 속히 낫고 반흔도 가볍다고 방영했다. 화상은 모세혈관이 확장돼 손상된 것이다. 이때 침 시술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면서 과립구를 증가시켜 화상을 속히 치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질병은 모세혈관의 수축에서 발생하므로 평상시의 질병 치료에 침 시술이 화상치료처럼 신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경락이나 침구치료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의하고 입증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은 아직 없다. 미국에는 45개 주에서 침술을 인정하고 미국보건성에서 10년간 엄청난 침술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며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락과 침ㆍ뜸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입증을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필자는 경락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경락계의 실질적인 작용을 확인했고, 침ㆍ뜸 치료의 효과성을 정의할 수 있었기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