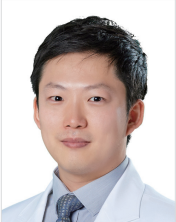내가 현직에 있을 때 서울대학에는 강의를 잘하는 명교수가 많았다. 문리과대학 철학과 박종홍 교수의 칸트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법과대학에는 법철학을 강의하는 황산덕 교수가 있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황 교수는 헌법개정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후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이다. 요샛말로 영욕이 교차하는 인생이었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는 물론 변호사는 로마법 체계에 따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야 하겠지만, 더 깊이 있게 법을 이해하려면 자연법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뜻깊은 얘기다.
의학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학문인 동시에 예술이고 동의보감에서도 도득기정(道得基精) 의득기조(醫得基粗)의 겸손한 생각을 지니라고 했다. 병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연치유력을 위주로 환자에 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의(醫)는 유자지일사(儒者之一事)였다. 선비가 되는 사람이 의서에도 통달해서 환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바와 같이 의사는 가능하면 대를 이어 가업으로 계승하는 것이 좋고 스승을 받들고 동료들과 함께 환자를 자연스럽게 다뤄야 한다. 역사를 훑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의사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넘지 않았다. 전설적인 얘기지만 화타(華他)는 조조의 두통을 수술해서 고쳐야 한다고 직언을 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의사는 부귀나 재산에 따라 환자를 다루지 않았고 누구나 다 같이 치료했다. 거기에는 보수가 따랐지만, 그 많고 적음을 따진 일도 없다. 자기 신분과 재산 정도에 따라 보답을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종의 관례로 통용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 이후 의사가 개업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생활을 윤택하게 할 정도지 큰 부자는 없었다. 개화기 이후 명성을 날리고 환자가 많았던 의사들은 꽤 된다. 우리나라에 산부인과를 정착시킨 신필수 박사와 그 아들 신한수 교수도 돈은 좀 있었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다. 초대 부통령이었던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도 삼양사(三養社)를 통해 기업을 일으켜 거부가 됐지만 수많은 젊은이를 길러내고 해외 독립운동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얘기는 정설이다.
의사는 선비며 선택된 사람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환자를 돕고 병을 치료하지만, 돈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동서양에서 통하는 공통된 얘기다.
요새 의사가 되면 거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다. 의사는 서양에서는 성직자와 비슷하게 존경받는다. 공부를 많이 해 환자를 치료하고 남을 돕는 일에 서슴지 않으면 의권은 자연히 확립될 것이다. 의사들의 일생도 화려하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의사상이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의도라 생각한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