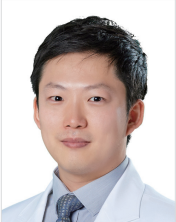침의 원조는 구침(九針)이다
침 기구의 원조는 구침이다. 침술의 원전인 '황제내경'에서 구침을 최초로 소개하였으나, '황제내경' 원문에는 구침에 대한 그림이 없다. 그 후 '침구대성' 초판호에 구침의 그림이 나와 있었으나, 청나라 때 제판된 '침구대성'의 구침 모양과 또 차이가 있다. 1980년대의 복제품과도 그림이 다르고 일정하지 않다.
'침구대성'에 소개된 구침의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침
② 원침(圓針)
③ 저침(일명 시침)
④ 봉침(鋒針)
⑤ 비침또는 피침
⑥ 원리침(圓利針)
⑦ 호침(毫針)
⑧ 장침(長針)
⑨ 화침(火針) - 일명 번침(燔針)
청나라 황실용 은침(銀針)의 평가
용두 끝부분은 뾰족한 자극용, 제2 손잡이 부분 정교한 세공, 굵기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고 뾰족, 실제 사용 가능
중국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침들의 출처는 1990년대 중국 베이징의 골동가게이다.
그러나 은비녀와 위의 황실 은침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 모양과 용도가 차이가 난다. 일반 은비녀들은 손잡이가 없고 길면서 단순하거나 손잡이에 장식이 돼 있다.
은침들은 침두가 있고, 침두에서는 피부를 압박하는 뾰족한 장치가 돼 있으며(비녀에서는 이러한 뾰족한 부분이 없다) 또한 손잡이 부분이 정교하고 회전, 제삽하기 쉽게 세공이 되어져 있다.
비녀는 머리 손잡이 부분은 있어도 침을 돌리고 찌르기 편한 손잡이 부분이 없다.
은침의 굵기를 보면 비녀보다는 모두 가늘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다. 그러나 비녀들은 몸통과 끝부분이 일정하다.
침두를 용두라고 하고 용두의 끝부분이 뾰족해 피부 압박용으로 사용했고 비녀는 용두 끝의 뾰족한 부분이 없다.

·침 재질 - 은침은 맥상 악화 심하지 않아
·스테인리스 침 재질은 피부 자극 시 음양맥상은 분명히 거의 모두 악화돼
·조선시대 철침은 맥상 조절 반응
은침은 맥상 악화가 심하지 않고 과거 철기시대의 철침도 맥상 악화가 없다.
현재 침술 자극이 우수하다고 생각해 전 세계가 침 시술을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다. 스테인리스에는 미량의 유해 중금속들이 들어 있다(스테인리스 제작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스테인리스 침이 인체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정확한 실험과 연구도 없이 시술하고 있다.
필자는 스테인리스 침을 피부에 접촉하거나 자극하고 음양맥상을 짚어보면 거의 모두 악화됐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침 재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위에서 발견된 은침으로 경혈 피부를 자극 실험해 보면 음양맥상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실험 방법은 경혈 피부에 접촉하고 음양맥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철침인 동침·바수들을 실험해 보면 맥상 악화 반응이 없었다. 조선시대의 철침은 독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창칼의 쇠나 말발굽쇠, 자감쇠로 침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침구대성'의 침제법 해독법도 연구의 대상이다. 조선시대의 철침들은 효과성이 있다.
폄석(돌침)·청동침·철침·은침 - 과거의 침 기구가 더욱 우수 - 음양맥상 조절 반응 있어
과거의 침 기구로는 은침, 순금침과 철침, 청동침, 폄석이 있다. 이런 침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면 음양맥상 악화가 덜하고 오히려 조절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신석기 시대의 폄석(돌침)은 아마도 흑요석(옵시디언, Obsidian)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에는 흑요석이 최고의 기구·무기였다. 흑요석은 유리질이 많아 날카롭고 피부에 접촉하면 음양맥상 조절에 도움이 된다.
중국 청대의 왕실용 은침 기구를 연구함으로써 침 재질의 우수성을 알게 됐고, 반면에 현재의 스테인리스 침 재질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옛 침 재질과 침 자극 기술을 다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