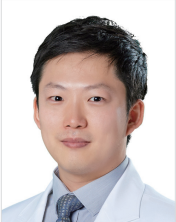K-뷰티 수출시장 다변화 주력… 3분기 대미 수출 중국 앞서
[2023 보건산업 결산/ 화장품]
연간 대중 수출액 23.9% 감소, 미국 규제현대화법은 내년 7월 발효
관광객 늘면서 명동 상권도 활기… 중소·인디 브랜드 빠른 성장세

올해 화장품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활기를 띠기 시작한 업계가 재도약 발판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수출 유망품목으로 급성장했던 K-뷰티는 이제 중국시장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내년 수출 90억弗, 6.0% 증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처음 중국을 앞서기도 했다.
2023년 국내 화장품 수출실적은 85억1200만달러로 전년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산업진흥원 자료). 코로나 팬데믹과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2022년(80억달러, 13.4%↓) 기저효과와 중국 이외 지역의 화장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화장품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수출 순위는 중국이 여전히 선두를 지켰으나 수출액은 전년대비 23.9%나 감소했다. 수출액 2위를 차지한 나라는 미국으로 올해 수출액 증가 폭이 가장(37.5%↑) 컸다. 이어 일본 (3.9%↑), 홍콩(29.0%↑), 베트남(26.9%↑) 순으로 수출액이 높았다(2023년 10월 누적 기준).
2024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90억달러로 전망된다.
판매사·제조사 실적 명암 엇갈려
올해 화장품 판매사와 제조사의 경영실적은 명암이 극명했다. OEM·ODM기업 '빅2'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 국내 중소기업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판매사 '빅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해도 부진한 성적으로 고전했다. 중국시장 실적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얼어붙은 내수시장과 환율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인상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로 기대했던 면세점 매출 회복세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뷰티 1번지' 명동 새단장 나서
정부가 올해 5월 엔데믹 선언에 이어 6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풀면서 '뷰티1번지' 명동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6년여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확연히 늘어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명동의 상징이던 H&B 매장이나 화장품 로드숍들도 일제히 재단장에 나섰다.
올리브영 '명동 타운'은 지난 11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올리브영은 방문 고객 90%가 외국인인 명동 타운을 글로벌몰과 연계해 국내 최초의 '글로벌 K뷰티 O2O(Online to offline) 쇼핑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명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명동 메가스토어점'도 리뉴얼을 마쳤고 네이처리퍼블릭도 지난 8월 '명동월드점'을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다.
중저가 브랜드 실적 호조 지속
올 3분기부터 외국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H&B채널을 중심으로 실적회복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CJ올리브영에 입점된 중저가·인디 브랜드들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다.
중저가·인디 브랜드들은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센스, 앰플, 마스크팩류 수출이 강세를 보였으며, 색조제품에서는 특히 립 관련 제품들이 일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호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방한 관광객은 2019년 대비 최소 100%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로드숍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
'가성비' 다이소, 올리브영에 도전
생활용품에서 시작해 뷰티·패션까지 영역 확대에 나선 다이소가 화장품 신유통 채널로 떠올랐다. 최근 불어닥친 실속형 소비도 저가 화장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가격대비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다이소 화장품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소는 2021년 '가성비 화장품'을 표방하며 뷰티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이나 클리오, VT코스메틱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배송전쟁에도 뛰어들었다.

다이소의 올해 1~8월 뷰티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선 다이소가 H&B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아성을 넘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MoCRA' 업계 대응책 마련 시급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발효 시기가 내년 7월로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까지 시행돼야 하는 화장품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플랫폼인 'FDA 코스메틱 다이렉트(Cosmetics Direct)'가 지난 16일 정식 오픈했다.
전자등록 플랫폼이 전격 오픈됨에 따라 MoCRA 규제 시행에 맞춘 업계 대응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미 수출업체들은 정보 제출을 위해 책임자와 시설 등록 대리인 지정을 서둘러야 하며,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MoCRA 규정에 따르면 FDA는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마감일까지 이뤄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설을 정지하고 제품을 회수(리콜) 조치할 권한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MoCRA 규제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경된 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등록을 위해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