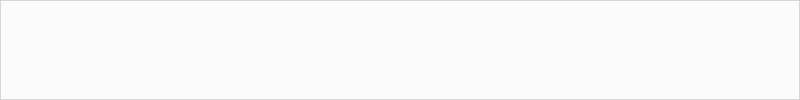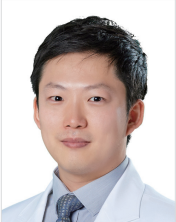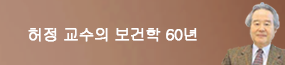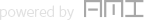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 19일 1000명 이상 규모의 '파격' 증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의사 집단의 반발 등을 감안해 발표 일정을 다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확대 계획에 여야 정치권은 나란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가며 이에 반대, 총력 투쟁까지 경고한 상태다.
의사가 부족하니 입학 정원을 늘리자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장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빼면 가장 적다. 반면 국민 1명이 1년에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을 2.6배 넘어 가장 많다고 발표된 바 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 하며 의사 수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의료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원인은 인원이 문제가 아닌 의사 배치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진 보장이 없으며, 불필요한 경쟁과 과잉진료 양상 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실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의대생 증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지역 동네병원은 지역의 환자가 찾아야 수익이 나는데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전국 각지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몰려든 지 오래다.
지역에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사들은 지방으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모집 공고을 냈지만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성남의료원은 서울 강남과 가깝고, 연봉도 2억8000만원을 내걸었지만 의사를 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필요한 곳으로 의사가 가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수 있다. 의사 수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시 퇴근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기피과 의사들은 당직에 또 당직에 수술은 쌓여있다.
여기에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봤던 기피과 전문의들은 피부 등 시술을 하는 개원가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라는 쉬운 답으로만 해결하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공백과 기피현상이 벌어지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로 의사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료계·환자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시급한 이유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