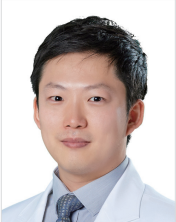여성의 70%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염은 '여성의 감기'라는 별칭이 존재한다. 자궁과 외부를 연결하는 생식 기관인 질에 염증이 생겨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초래되는데 주로 세균이나 칸디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 유형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세균,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일수록 질염이 쉽게 발생한다.
종류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된다. 감염성에는 세균성, 곰팡이성, 원충류성, 염증성, 바이러스성이 있고 비감염성에는 자극, 위축성, 외음부 이상 등이 있다. 가장 흔한 칸디다성 질염의 경우 쉽게 재발하며, 트리코모나스의 경우 성병의 일종이기에 성 파트너와 동반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헤르페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병 검사 역시 병행하는 것이 좋다.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맨 손으로 긁는 것, 면역력 저하, 피로감, 생리, 성 접촉 전후 등 질 내 환경이 바뀔 때 쉽게 생길 수 있다. 평소 질은 pH 4.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유익한 정상 세균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외에도 감염, 알레르기, 스트레스, 화학적 자극(피임약 등), 이물질 삽입, 지나친 질 세정제 사용, 임신, 항생제의 과다 투여,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이로여성의원 송지영 원장은 "본래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유산균의 영향을 받아 약산성, 무색, 무취, 점성을 지니고 있다. 겉으로 봤을 때 맑고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보이며 배란기 때에는 점도가 높아져 희고 마르면서 뭉쳐지게 된다. 냄새 역시 약산성이기에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질염에 의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데, 원인균에 따라 다르다. 분비물 양이 늘어나고 거품, 지나치게 흐르거나 단단하게 뭉치는 것, 색깔, 냄새 변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질 분비물이 노란색, 초록색을 띄거나 생리 전이나 착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핑크색, 갈색 등으로 나타난다면 질염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생선 썩은 내, 피비린내 등 악취가 난다면 염증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해주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분비물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려움증, 따가움, 배뇨통, 성교통 등을 보일 수 있다. 방광염을 동시에 앓거나 질염 후 방광염으로 이어지는 등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악취가 나거나 가려움증, 따가움 등이 있을 때에는 연령, 성 경험 유무에 관계 없이 산부인과를 통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치 시 만성 질염, 골반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는 속옷, 하의는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착용하며, 생리대나 팬티라이너 등은 자주 갈아 습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세정제 사용은 피해야 하며 대소변을 본 후에는 휴지를 뒤로 가는 방향으로 닦아야 한다.
외음부에 손을 대는 일, 즉 세척하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탐폰을 착용하는 등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좌욕이나 반신욕을 2~3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기에 규칙적인 운동, 식사, 취침 등으로 면역력과 장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과로하거나 피곤하면 질염이 쉽게 생기기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데,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칸디다 질염의 재발률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해야 한다.
세척 시에는 주에 1~2회 정도 약산성 여성청결제를 사용하고,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생리 도중이나 질염 치료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평상시에 이를 지켜주는 것이 좋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