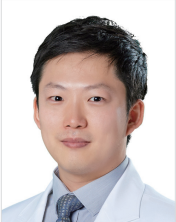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상응점(相應點)의 출혈요법]
▷지난호에 이어
⊙ 중국 침술 전래 - 우여곡절 많아
돌침(편석) 한반도에서 시작 발견, 청나라 말기 - 침술금지령 100년간 침술 중지
경혈의 스테인리스 침과 뜸 자극 - 분명히 음양맥상 반응 악화 많아 위험
침술이 약 2000여 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나 침의 원조 격인 돌침을 폄석이라 해 한국의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때 함경도 웅기군 송평동 유물에서 돌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동해 중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곳의 돌이 누에처럼 길면서도 뾰족하기 때문에 침으로 썼다고 하나 돌침하고는 모양이나 재질이 다르다.
청나라 말기 1922년에 침과 뜸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침사 배출을 영원히 정지시킨 이후 청나라에서는 침술 연구, 침사 배출, 침구 치료는 사라졌다. 1940년경 장개석 국민당 총통 당시까지도 침 치료 금지법안을 초안까지 했었다. 약 120년간 침술 금지 기간이 있었다.
필자의 현재 생각으로는 청나라 정부의 판단이 대단히 훌륭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침과 뜸·지압으로 경혈에 자극을 주고 맥진으로 확인해 보면 음양맥상이 거의 모두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나 우리나라 일부에서 경혈에 스테인리스 침과 뜸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재고를 해야 한다. 경혈에 침·뜸 자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올바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철침·청동침 실험은 예외다).
청나라 때 침·뜸 금지 정책은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학사를 보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침의(鍼醫)와 침구서가 소개되지 않았다. 한국도 조선 말기에 침의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조선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전국에 유명한 침의와 침구서가 많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1822~1940년대까지 침술 이용이 없었으나 일반 서민층에서는 응급처치법으로 이용한 것 같다.
'침술사고'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천민(賤民)들은 글자도 모르고 옷도 남루하게 입었던 사람이라고 하며 그들이 응급처치로 인사불성·졸도·급체 등에 침술을 사용했었다고 기록돼 있다(1980년대 WHO에서는 중국 침구사들을 맨발의 의사라고 불렀던 이유이다).
100년 이상 침·뜸이 중지됐다가 1940년경 중국의 모택동은 의료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술을 허용하자 침술에 대한 지식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침술 사용으로 사망사고, 부작용 등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었다.이와 같은 사례들을 들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지식과 방법들을 소개한 책이 '침술사고'이다.
1980년 이전까지의 응급처치 - 따주기 방법 널리 사용
조선시대 후기에 침술 사용이 자취를 감추자 민간에서는 동침·바수(굵고 날카로운 긴 침)로 응급처치에 이용을 했었다. 동침은 굵은 철사로 만든 침이고, 바수는 납작한 형태의 끝부분이 날카롭게 만들어 피를 빼기 위한 침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무의촌·시골·산골·민간에서 응급처치로 이용해 인사불성·급체·경기·염좌 등 급성질환에 널리 이용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식 침사·구사 제도를 들여와 다시금 침구사가 부활되고 침사·구사가 시술을 했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동침이나 바늘, 비녀, 뒤꽂이 등을 따주기에 이용해 소량을 피를 내어 응급처치로 이용했다.
제일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팔을 두드리고 주무른 다음 엄지 끝마디를 실로 꼭 묶은 후 엄지 끝이 빨갛게 충혈되면 피를 빼는 것이다. 수지침에서는 I38(엄지 쪽 - 손톱 위의 평평한 곳)을 찔러서 검은 피 2~3방울을 빼낸다. 이러한 응급처치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었다. 또는 제2지의 손끝을 찔러서 응급처치로 이용을 했었다.

다음의 여러 가지 응급처치 출혈 치방을 알아보자.
1) 십선혈(十宣穴) 출혈 <그림>
십선혈(十宣穴)은 양손 내측 손끝에 위치한 요혈이다. 주로 손톱에서 내측 끝으로 제일 끝부분이며 열 손가락이므로 십선혈이라고 한다. 각종 인사불성에 제일 많이 이용한다. 지금도 각종 인사불성·졸도·곽란·급체에 널리 이용한다.
인사불성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① 환자를 가급적 따뜻한 곳에 편하게 눕히고 넥타이·신발은 벗기고 옷으로 환자를 덮어주며 발을 높이 들어준다.
② 즉시 병원응급실이나 119 등에 연락을 취한다. ①과 같이 처치하면서 119 등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③ 구급요원이 오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우선 손가락을 만져보면 대부분 체온이 낮아져 있다. 손가락을 비벼준 다음에 손끝을 뾰족한 기구로 반복해 눌러준다.
④ 손끝을 깨끗이 닦거나 소독하고 출혈침으로 1mm 정도 찌른다. 검은 피가 나오면 몇 방울 더 짜준다. 맑은 피가 나오면 1~2방울만 뺀다. 피가 나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비벼주고 피를 짜낸다.
⑤ 다음에는 기마크봉S나 수지침으로 A8·12·16과 숨 잘 쉬는 치방인 C1·2·8, A18·20· 22·28을 자극해 준다.
⑥ 환자가 정신을 차려도 한동안 안정을 취한다. 구급요원이 오면 인계한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면서 중지 끝을 강자극한다(PEM으로 강자극한다). 환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 상응점을 찾아 출혈한다.
⑦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가급적 서금수를 마시게 하고,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하면 군왕산삼 1봉지를 먹게 한다.
⑧ 기타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⑨ 정신을 차려도 가급적 안정을 취하고 서암뜸을 떠서 체온을 보호한다.
<다음호에 계속>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