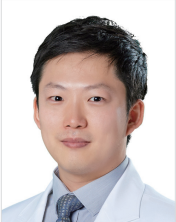이미 작고한 동아제약 강중희 회장은 사석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는 원료에서 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제대로 된 제약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강중희 회장이 말하던 옛날에는 자전거에 여러 가지 상비약을 매달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며 약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자전거 약장수의 전통을 일본 도야마(富山)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까지도 근대적인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먼 옛날부터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이고약과 조고약이다. 해방 이후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오 박사가 이고약집 딸과 결혼해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원료에서 완제약 제조과정까지 모두 국산화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세월에 따라 병도 달라졌다. 조선조 500년을 통해 왕들이 고생하고 죽어간 사인을 보면 첫째가 종기였다. 영조와 더불어 개혁 군주로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자 힘썼던 정조도 목에 난 종기 때문에 급사했다.
명성왕후가 국제정치를 헤엄쳐 우리나라 국권을 되찾고자 힘썼던 시절에도 가장 무서운 병이 종기와 두창(痘瘡, 천연두)이었다.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창은 일본으로부터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에 의해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마련됐다.
일본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외과 교과서에서 일본사람들이 걱정하고 걸리기 쉬운 외과질환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기였다. 우리나라도 20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개인위생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결과 종기가 흔했고 조고약과 이고약이 토착 제약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고약은 천주교 신자였던 이명래(李明來)가 프랑스 선교사 신부의 비법과 국내에서 사용하던 민간요법을 합쳐 개발했다. 이 이고약은 1905년 우리나라 전통의약 1호로 판매됐다. 이명래 고약보다 뒤에 나왔지만 더 이름을 떨쳤던 조고약은 한의사로서 의생면허를 받고 외상환자를 다루는 종의(腫醫)로 활동한 조근창이 1913년 설립한 천일약방에서 생산됐다. 이제는 모두 옛 얘기가 됐다. 지금은 조고약이나 이고약을 파는 약국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질병사가들에 따르면 불결과 영양불량으로 인해 유행했던 질병들은 이젠 후진국가라 불리는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병은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