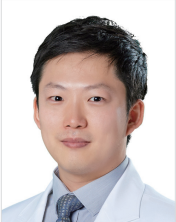현역으로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중국은 거의 전 지역을 다녀왔다. 내몽고의 사막지대와 우르무치, 투르판, 신강자치구, 라사와 시가체 그리고 티베트도 둘러봤으며, 운남성의 소수민족과 장족의 생활상도 보았다.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도 갔다. 베트남에서는 들쥐를 잡아먹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나라는 인도다. 인도는 뉴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인도 지방과 마드라스를 위시한 남인도 지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북인도 바라나시에서 시체를 불태워 그 잔재를 강에 뿌리는 힌두교의식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보건학자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벵골만을 비롯한 남인도 지방의 토착병인 콜레라의 창궐이었다.
인도 콜레라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만 증상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도 빠르다. 우리나라 개화기 전염병 양상과는 많이 다르다. 소설 '토지'에서 보듯 당시 우리나라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중세 유라시아대륙을 휩쓴 몽골제국은 '행랑 속 들쥐'를 유럽에 전파해 흑사병의 원인이 됐으며, 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1/3이 죽었다. 그 결과 농노제도가 없어지고 소작인제도로 바뀌어 유럽 근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18~19세기에 걸쳐 유럽 제국주의 세력은 인도와 인도차이나,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콜레라 유행을 불렀다. 이 콜레라는 1차와 2차에 걸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퍼져나갔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무서운 역질로 기록되고 있다.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과 때를 같이해서 유럽을 휩쓴 매독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른바 '창병'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다. 화류계에 드나들면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화류병'으로도 불렸다. 영어로 성병은 비너스의 여신을 잘못 건드려서 생겨난 병이라고 해서 아직도 '비너스의 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유곽과 집장촌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매독으로 죽어갔다. 눈이 멀고 코가 떨어지는 불구가 되기도 했다. 아직도 종로5가에는 '제창원'이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있다. 창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페니실린이 보편화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았다.
지금은 항생제와 설파제가 개발돼 전형적인 매독은 찾아볼 수 없다. 남인도에서도 무서운 콜레라의 모습은 없다. 공생관계는 아니지만 타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전염병은 약화 되거나 무력화된다. 이것이 전염병의 종말이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