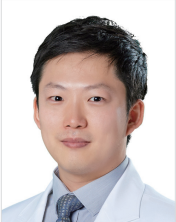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을 놓고 ‘성명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라며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진단학, 신경학, 영상의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과학, 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에 30~120시간의 IMS교육 및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이번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했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므로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다.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아니고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며,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다”며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인 과다사용 및 손상에 의한 인체조직의 과민화와 주위 조직의 유착인데, IMS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손상을 덜 주는 미세하고 끝이 무디며 둥근 바늘을 사용할 뿐 경혈이론에 근거한 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바늘의 사용은 IMS뿐 아니라 각종 수술적 치료시에도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과민화 억제를 위한 자극과 유착제거를 위해 바늘을 헤치고 나가며 전진 및 후퇴하고 밀고 베고 회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침술의 보사, 제삽, 작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한의계에서 ‘득기’라는 침술용어를 IMS의 창시자인 Chan Gunn가 썼다고 하는데, 이 저서는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적 기술이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며, 이 저서에 득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IMS가 침술이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Gunn의 IMS는 ‘근육내 자극법’의 약자이지만 한국의 IMS는 Gunn의 IMS를 더욱 현대의학적으로 발전시킨 신기술로서 ‘중재적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자극술’의 약자라고 덧붙였다.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의 시술 위주이고, 주로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에 도달해야 하는 IMS는 현대의학적 교육 수료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부시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수년간 IMS 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술률을 줄이며 사회생활 복귀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임상결과를 많은 논문들을 통해 학계에 보고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경험을 축적한 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반복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 손상으로 과민화 및 유착이 된 조직 도달을 목적으로 이를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