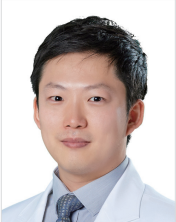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전염병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을 타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퍼진 것이 대부분이다. 중세의 흑사병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유일한 경우인데,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이 유럽 정복을 위해 파견한 병사들에 의해 확산됐다.
중세 유럽이 근대사회로 바뀌는데도 영향을 줬던 흑사병은 몽골군이 휴대했던 물품과 초원에 살던 쥐들의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 후 흑사병은 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아직도 야생 쥐를 잡아먹는 베트남에서는 매년 수십명에서 1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쥐에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과정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아 공기를 통해 전염됐던 유럽에 비해서는 그 위험도가 매우 낮다.
흑사병을 제외하고는 유럽 대항해시대를 거쳐 동인도회사 설립과 마르코 폴로 이후 늘어난 침략전쟁, 서양과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유입된 물품과 함께 전염병도 유입됐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근대화는 유럽의 문물과 함께 전염병도 받아들였다.
그 첫 번째가 콜레라다. 콜레라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 인도차이나를 거쳐 아시아 여러 무역항을 거점으로 번져나갔다. 1820년까지 남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콜레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순조 때 크게 유행(1821~1822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1822년에는 무역항 나가사키를 거쳐 일본에도 전파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통해 수교를 맺은 후에는 거의 해마다 콜레라가 발생했다. 조선 말기에는 일본사람들의 권고에 따라 부산에 피병막(避病幕)이 생겨났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서울에도 순화병원이 설립돼 콜레라에 걸리면 이 병원에 격리됐다. 해방 후 순화병원은 시립병원으로 전환돼 일반 환자들도 진료하게 됐다.
박경리 원작 ‘토지’에도 콜레라가 등장한다. 최참판댁이 있던 하동에 콜레라가 번져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익힌 음식과 끓인 물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정구가 이 난국을 피해 훗날 최참판댁의 많은 재산을 빼앗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콜레라는 아시아에서 인도만 일 년 내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퇴치하기 위한 WHO 연구센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 대규모 유행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장티푸스와 콜레라는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인성전염병이다. 여름철이면 조심해야 할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