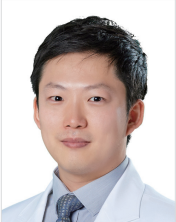일제말기 나가사키 형무소 복역 중 생체실험을 당하다 죽은 윤동주 시인이 생각난다. 나가사키에 있는 제국대학의학부는 일본군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열대의학에 관련된 국책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식민지관리와 전쟁 수행을 위해 의학연구를 했던 일도 많았다.
아직도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선 다양한 열대의학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본 바와 같이 본토 방위를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이오지마 일대는 신탁통치를 했지만 원래 일본 영토였다. 더운 지방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화기전염병과 말라리아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몇 해 전 고베대학에서 개최한 국제열대의학세미나에 참여한 일이 있다.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온 의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제발표를 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열대병이란 애매한 개념이다. 아직도 잘 팔리는 후지가와 유우(富士川游)의 일본의학사를 보면 명치시대 일본에선 말라리아가 흔한 병이었고 나병도 많았다.
우리나라 소록도에도 격리수용소가 운영돼 왔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발가락이 하나 빠졌다는 유명한 한하운 시인의 얘기같이 발가락과 손가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한센씨 병이다. 소록도 간호사였던 헌신적인 수녀들의 얘기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전국에 나병환자 수용소가 생겨났으며 그 대표적인 정착지가 바로 소록도였다. 그러나 전염력도 세지 않고 격리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수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서울근교에도 아직 꽃동네가 남아있다.
역사는 그런 것이다. 한때 말라리아가 학질이라고 해서 국민병으로 관심을 끌었다. WHO도 특별기구로 보건복지부 안에 말라리아 박멸팀을 운영한 적도 있다. 이제는 옛날얘기가 됐다. 모기 번식기에 필요한 채혈에 쓰일 수 있는 가축이 거의 없어진 북한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에서만 생겨나고 있다.
영국도 유럽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개척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함께 열대의학 연구가 활발해졌다. 보건학도 이러한 식민지정책과 관계가 있었다. 유명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원래 이름은 위생학 및 열대의학대학원이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그 이름도 바뀌어져 이제는 런던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대학원으로 명칭 자체도 바뀌었다.
이처럼 공중 보건학은 유럽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식민지개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열대의학 및 위생사업으로 시작됐다. 옛날얘기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