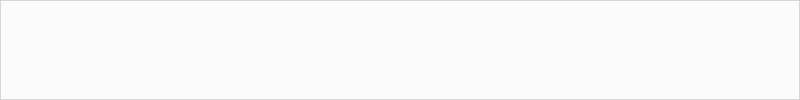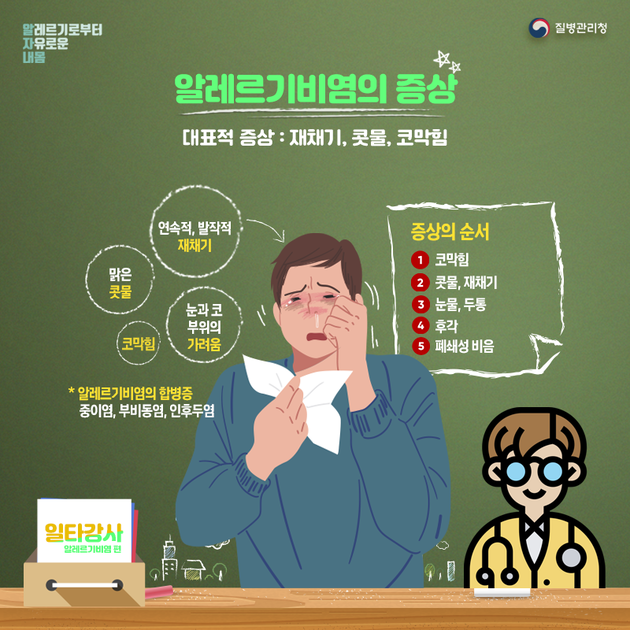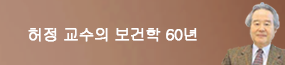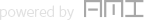우리나라에도 현대 의학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미진단 희귀질환자 수가 연간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약 6.5년간 진단방랑을 하고 있어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만명 당 5명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7,000~8,000개의 희귀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약 1000개의 희귀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진단이 어렵거나 현재의 의학지식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미진단 희귀질환’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진단 연구과제에 등록한 사람이 2017년 97명, 2018년 상반기 164명 등에 비추어 미진단 희귀질환자 수가 연간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들 환자들은 진단을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진단방랑(diagnostic odyssey)을 겪게 되는데, 정립된 진단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전체 검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방랑의 평균 기간을 미국 7.6년, 영국 5.6년, 한국 6.5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소 1년에서 16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0%의 희귀질환이 유전적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이를 활용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로 진단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미진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환자가 희귀하기에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임상 증상과 관련한 신규 돌연변이를 발견하면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되어 국가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해 지난해 시범연구를 실시하는 등 미진단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적절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13일 희귀질환 지정 및 확대, 의료비부담 경감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목록 총 927개를 발표했다”면서 “기존 827개의 희귀질환 외에 100개 희귀질환을 추가했으며, 명확한 진단명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에 1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