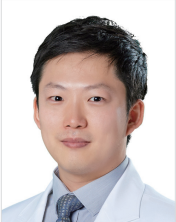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
소화기증상 최다… 피부병ㆍ신경증순 / 약물 자체보다 오처방ㆍ과잉투여 문제 신농본초서엔 부작용약물 따로 분류 / 한방약학서도 투약 금기사항 중요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약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대 부속병원 동양의학과 미우라 오또씨는 ‘한방약의 부작용’이라는 연구논문(日医大誌 1999년 제66권 제4호)을 통해 한방약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미우라씨는 이 논문에서 한방약은 먹을 때 한방방제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적응상태 등을 잘 지켜보고 관찰을 한다면 안전성도 있는 약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약 부작용에 대한 독자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 논문을 싣는다. /기획취재팀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의한 간질성폐염(間質性肺炎) 사망 사례 이후 한방방제의 부작용 문제는 동양의학계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양의학과에서는 제1병원 동양의학센터 당시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이 문제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고대에도 부작용 ‘경고’ ▼부작용의 인식 한(漢) 대(기원 전후)의 신농본초서(新農本草書)에는 부작용이 잘 나오는 약물이 분류되어 있고, 고대로부터 부작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후세의 한방약학서에는 부자(附子) 등의 독성약물, 임신부 금기약, 투약금기상태, 독성약 완화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은 한방약학습의 중요사항이었다. 한방약 안전신화는 근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빈도와 출현시기 빈도의 연구는 본 한방과의 검토이외에는 없다. 3,977건의 처방 건수 중 41건(1.0%), 이것이 검토결과이다. 이것은 약품첨부 문서의 ‘가끔(0.1~5.0%)’에 해당하고, 일정빈도에서 부작용은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78%가 3일 이내이고, 한 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부작용이 출현하고 있다. 부작용은 복용 후 단기간에 출현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장기복용 도중의 부작용 가능성은 낮다. 예외 중의 한 사례는 장기 투여중의 한방약 적응 상태증상의 변화에 의해서 출현했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했다. ▼증상과 경과 심와부통(心窩部痛) 등의 소화기증상(약 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습진 등의 피부증상(약 24%), 동계 등의 신경증상(약 12%)이었다. 그 외 다른 조사와 같았고, 소화기증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 등 중독 가능성 커 팔미환(八味丸)ㆍ사물탕(四物湯)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한방방제의 투여, 위장허약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피부증상은 피부질환 환자에서, 신경증상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한방약을 먹을 때 쉽게 나타났다. 중독과 부작용으로는 부자(附子) 중독이 알려져 있다. 근년에는 독성완화제제(포부자)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사망한 사례의 보고는 없었다. 말하자면 부자의 배합 방제사용을 할 때 중독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자는 신경독으로 마비, 근육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초기 발생증상으로서 혓바닥 마비와 위화감이 많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투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 경과를 말하면 중지한 것이 대부분(약 63%), 게다가 감량과 식후 계속 복용으로 경쾌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과였다. ▼원인 증상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것은 주로 동양의학 전문의의 많은 의견이다. 확실히 본 검토에서도 부작용 출현 방제의 무효율은 약 66%이고, 증상의 판단 잘못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단, 약 22%의 유효사례에도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고, 원인은 이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알레르기환자 약물과민 고려 여기서 유효사례를 검토하면 그 중에서 4가지 사례는 질병증상의 경쾌(輕快)를 보고 있다. 이 사례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명현(瞑眩), 즉 증상 호전 전의 유해증상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요법가, 일부 동양의학 전문의들 사이에 이 명현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명현을 한방방제 부작용의 이유로 여기는 민간요법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본 검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명현현상 이외의 많은 유효한 사례에서는 식후의 복용이나 감량으로 부작용의 경감을 보고 있는데, 한방약의 과잉 투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치료목적의 주작용이 아니고 부차적인 작용이 전면에 나온 것으로, 즉 협의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과잉투여로 문제로 되는 것은 한방약국과 중국산 한방약 등의 복용자의 중복 투여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알기 쉽도록 알리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본 검토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성질환 환자의 부작용은 약 29%이고, 다른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부작용은 약물과민이 많은 것 같다. 다시로(田代)씨는 한방방제의 알레르기가 간질성폐염에 관여하고 그 원인으로서 ①면역강화성분의 존재 ②한방방제의 구성생약중의 황금의 주성분인 ‘바이카린’의 대사이상 ③향기성분중의 ‘아루디비도’ 등의 알레르기 ④분말과정의 폐 속에 침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약물 처방시 환자상태 중요 알레르기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작용 출현은 한방방제 그 자체보다도 투여된 개체측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알레르기성질환 환자와 약물과민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보다 신중한 투여와 관찰이 필요하다. ▼결론 일정 빈도로 한방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틀린 처방과 과잉투여 등의 부적절한 투여, 약물과민자에게 투여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약물 그 자체라기보다도 환자 개인의 상태가 중요한 점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출현율이 낮고 게다가 대부분이 경증이다. 또한 복용을 중지함으로써 부작용 증세가 개선되고 있다. 투여할 때 한방 방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적응상태를 잘 지켜보고, 투여 후에도 충분한 관찰을 하면 안전성이 높은 약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기획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