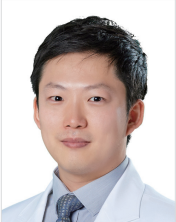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바이오 회사의 수는 998개이다. 이 중에는 상당수 전통 식품 회사들과 직원 수 1~2명의 개인 자영업 회사들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BT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회사의 수는 절반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벤처열풍이 한참일 때, 바이오 스타트업(신규 창업사)의 수는 약 660개까지 된 적도 있으나 지난 15년 동안 60%이상의 회사가 정리됐고 나머지 회사들 중에도 활동이 별로 없는 회사도 상당수 발견된다.
벤처 창업이란 시작부터 실패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바이오 벤처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실용화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화에 도전하게 되는 것도 벤처 성공률이 10%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가볍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비슷한 형태의 도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제도가 벤처 창업이다.
미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미래 사회를 알아보는 척후병의 기능을 벤처 회사들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두세 개 창업하고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창업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캐피탈로부터 몇 억의 돈을 받아 창업하고 몇 번의 증자를 한 후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마련이다. 뭔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돈만 쓰고 성과가 없던 것 아니겠느냐는 무언의 평가가 족쇄처럼 창업자를 속박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나이에 창업하고 돈을 직접 만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벤처의 경우 아무리 창업자가 열심히 해도 전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사회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길어지면 결국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벤처를 시장에 상장하게 되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창업 이후 천사투자자(에인젤투자) 단계를 거쳐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이 개입해 몇 년 간의 검증과 준비를 한 후에 나스닥에 상장되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벤처캐피탈들의 성급한 투자회수전략으로 벤처의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가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의 성공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면 창업자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게 된다.
바이오 의료산업은 앞으로 3~5년 이내에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 저효율의 현행 보건의료 제도, 2025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의 건강보험의 파산 등의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결국 바이오 보건의료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벤처 창업이 답이 될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바이오 의료산업으로의 진입은 이제 필수적이며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개혁, 병원 및 개원가의 협조 등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