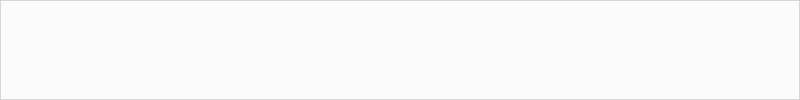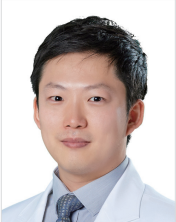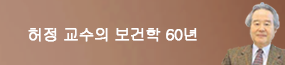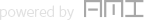|
"전공의들은 지금 암행어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공의들이 자기 병원에 암행어사라도 보내 수련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울부짖고 있다. 최근 일선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파업을 했다. 수련환경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늘 문제가 돼 왔고 개선책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늘 묵살됐다. 수련병원들 역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공의들을 싼값의 의사노동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됐지만 실제로는 전공의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따고 나면 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수련기간 동안의 고된 일과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원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폐업을 하기 일쑤이며, 교수가 되려고 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 순서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빈크리스틴 사건’이 생각난다. 한 전공의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다 결국 의료사고를 내고 만 것이다.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의 처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수하게 수련된 전공의는 훌륭한 사회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나서 이젠 전공의들이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